[MT시평]민주주의를 구하는 세렌디피티
머니투데이 김동규 (국제시사문예지 PADO 편집장)
2024.03.18 02: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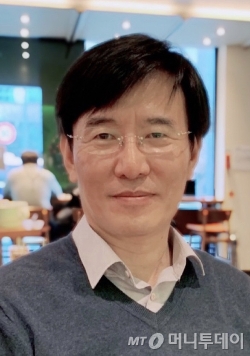 김동규(국제시사문예지 PADO 편집장)
김동규(국제시사문예지 PADO 편집장) 우리는 알고리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컴퓨터 화면이 귀신같이 내 취향을 알아내 내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내놓는다. 또 검색기능은 당연히 내가 찾는 것만 보여준다. 좋아하는 것만 나오는 인터넷 세계는 그래서 하루종일 놀아도 재미 있다. 나는 한때 니체 철학을 좋아했는데 D H 로렌스의 '채털리 부인의 사랑'을 읽으면서 니체적 요소가 짙게 배어 있음을 느꼈다. 혹시 로렌스와 니체의 관련성이 없을까 검색을 해봤다. 내 생각대로 로렌스는 니체에게 영향을 받았다는 논문과 글이 다수 나왔다. '내 생각이 맞았어!' 나의 통찰이 만족스러웠다. 그런데 과연 내 생각이 맞았을까. 로렌스처럼 풍부한 생각을 하는 작가에게 니체의 영향만 있었을까. 니체에 반대하는 사상에도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검색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게 하는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검색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회의보다 확신을 하기 쉽다. 민주주의는 회의주의자들이 함께 논의하는 공동체지만 알고리즘과 검색의 동굴에 갇혀버린 우린 타인과 세상의 존재를 무시하고 자신을 과신하게 된다.
알고리즘과 검색의 반대쪽에 세렌디피티(serendipity)가 있다. 알고리즘만큼 일상화하지 않은 영어단어인 것을 보면 그다지 환영받지 못하는 듯하다. 하지만 이 세렌디피티를 살려내는 것이 알고리즘의 동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 세렌디피티는 '우연한 발견'을 의미하는데 오프라인의 도서관과 신문에서 경험할 수 있다. 수백 년 된 세계적 대학 도서관에 가면 수백만 권의 오래된 책이 쌓여 있고 내가 찾으려고 하는 책은 그 책더미 어딘가에 숨어 있다. 도서관을 현대화해 내가 찾는 책을 자동으로 내주는 시스템을 만들면 좋으련만 세계적인 대학 도서관들은 이런 낡은 시스템을 선호한다. 명문대학 도서관일수록 옛날식이다. 다 이유가 있다. 우린 이 쌓여 있는 책더미를 뒤지면서 세렌디피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종이로 된 신문 지면을 뒤지면서도 이런 세렌디피티를 경험할 수 있다.
미지의 세계와 만남은 내 인식과 감각의 지평을 넓힌다. 부모가 열 살 아이의 취향만 존중해준다면 그 아이의 지평은 열 살에 고정될 위험성이 있다. 플라톤은 '고르기아스'에서 나쁜 정치가를 제과업자에 비유하며 비판했다. 몸에 좋은 음식이 아니라 대중이 좋아하는 달콤한 음식만 제공해 박수를 받으려 한다는 것이다. 플라톤은 제과업과 나쁜 정치를 '아첨의 기술'이라고 폄하했다. 좋은 정치가는 대중에게 건강한 음식을 제공하려는 사람이다. 지금 당장의 입맛에는 맞지 않지만 익숙해지면 평생 즐기게 될 건강음식을 제공하는 영양사 같은 정치가다. 오래된 도서관, 종이로 읽는 신문, 거리를 걷다 우연히 보게 되는 광경, 삶의 길목에서 우연히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우린 세상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나 자신이 얼마나 작은지를 알게 된다. 나의 한계를 알게 돼야 우린 동료시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인다. 이것이 민주주의다. 알고리즘과 검색이라는 '아첨의 기술'이 포악한 독재자의 심성을 기른다면 세렌디피티는 겸허한 민주주의 시민의 덕성을 기른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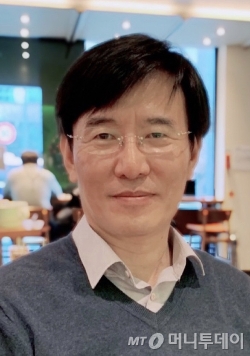 김동규(국제시사문예지 PADO 편집장)
김동규(국제시사문예지 PADO 편집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