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뒤 조씨는 동창과 병원에 가 검사를 받았다. 신장 기증을 하려면 혈액형이 일치하는 등 여러 조건이 맞아야 한다. 기증은 최종 불발됐다. 기증받기에 동창 병세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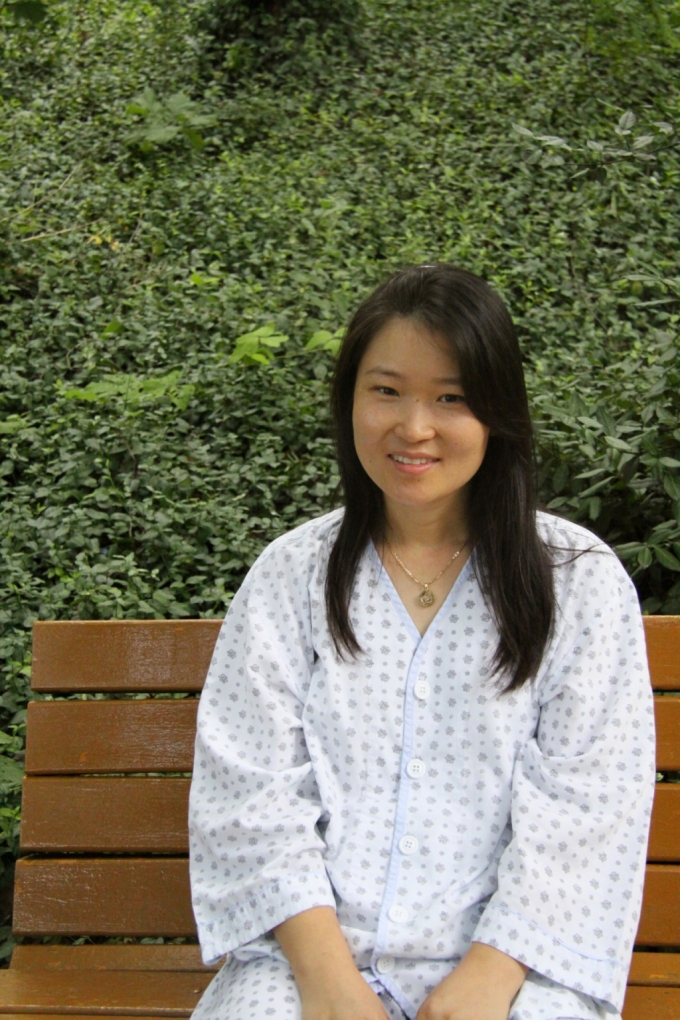 2009년 조애영씨(당시 36)는 생면부지 50대 여성에게 한쪽 신장을 기증했다. 기증 당시 조씨 모습. /사진제공=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2009년 조애영씨(당시 36)는 생면부지 50대 여성에게 한쪽 신장을 기증했다. 기증 당시 조씨 모습. /사진제공=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예상치 못한 난관이 있었다. 의학계에 따르면 사람의 두 신장 중 작은 신장이 기증된다. 기증자 건강을 보장하는 취지다. 조씨는 오른쪽 신장을 기증해야 했다. 그런데 손상 없이 꺼내려면 갈비뼈 하나를 잘라내야 했다. '왼쪽 신장을 기증하면 안 되냐?' 물었지만 의사는 "의학계 지침상 안 된다"며 '기증을 포기하면 어떻냐?'고 물었다. 조씨는 거절했다. 이식을 기다리는 여성이 떠올랐다.
이식인은 의료진에게 조씨 퇴원 날짜를 물었다. 수술 열흘 뒤였다. 이식인은 조씨 퇴원 날 조씨가 머물던 층으로 향했다. 환자복 차림에 주삿바늘을 꽂고 있었다. 같은 시각 조씨는 퇴원하러 엘리베이터를 향하고 있었다. 멀리서 자신을 바라보는 눈길이 느껴졌다고 했다.
그쪽을 보니 이식인이 50m 떨어진 복도에서 자신을 보고 울고 있었다. 단 한번 만난 적 없지만 서로가 누군지 느낀 셈이었다. 조씨와 이식인은 다가와 껴안고 함께 울었다. 이식인은 조씨를 보고 "아이고, 이렇게 어려요" "나 때문에 미안해요"라고 했다고 한다. 조씨는 "괜찮아요" "건강히 사세요"라고 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1991년 한쪽 신장을 기증한 표세철씨(맨 왼쪽). 투석받느라 학업도 포기한 부산시 한 여고생 박정화씨(가운데)에게 기증했다. 한번도 만난 적 없지만 생명을 살리고 싶어 기증을 결심했다고 한다. 박씨는 건강한 어른이 돼 중학생 딸을 키우는 엄마가 됐다. 박씨 어머니 양숙주씨(오른쪽)도 신장을 기증했다. /사진제공=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1991년 한쪽 신장을 기증한 표세철씨(맨 왼쪽). 투석받느라 학업도 포기한 부산시 한 여고생 박정화씨(가운데)에게 기증했다. 한번도 만난 적 없지만 생명을 살리고 싶어 기증을 결심했다고 한다. 박씨는 건강한 어른이 돼 중학생 딸을 키우는 엄마가 됐다. 박씨 어머니 양숙주씨(오른쪽)도 신장을 기증했다. /사진제공=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생존 시 기증은 주로 가족, 지인 사이 이뤄진다. 그런데 조씨처럼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에게 장기를 기증한 사람들이 있다. 의학계는 조씨처럼 기증자가 대상자를 정하지 않고 순수하게 기증하는 사람을 '순수기증자'라 한다.
표세철씨(60)도 그중 한명이다. 1991년 그는 스물아홉살이었다. 해병대 중사로 갓 전역했을 때였다. 남 도울 일을 찾다가 신장 기증을 결심했다. 표씨 신장은 투석 받느라 학업을 포기한 부산시 한 여고생 박정화씨에게 기증됐다.
기증은 기증으로 이어졌다. 당시 박씨의 친부는 지병이 있었고, 친모는 신장 조직이 맞지 않아서 딸에게 신장 기증을 못했다. 표씨가 기증자로 나서자 박씨의 친모 양숙주씨는 '나도 생명을 나누겠다'며 다른 환자에게 신장을 기증했다.
10여 년 전에는 이런 순수기증이 한해 평균 45건 이뤄졌다. 하지만 2011년 6월 장기등이식에관한법(장기이식법)이 개정된 후 한해 한 자릿수 수준으로 줄었다. 법 개정 전에는 장기기증 등록을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장기기증본부) 등 시민단체, 민간기관도 받았는데 이후에는 병원 등 의료기관만 받을 수 있게 됐다.
혹시 모를 장기매매 등 불미스러운 일을 막으려는 취지였다. 하지만 의료기관의 역할이 장기기증 등록에 국한돼서 전처럼 기증희망자 발굴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기기증본부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기증 등록을 받을 때보다 희망자 발굴이 줄었다"고 했다.
생존 시 기증을 하려면 사전 검사가 필수다. 현재로서는 사전 검사비가 기증희망자 몫이다. 나중에 기증이 실제로 이뤄지면 검사비를 환급받는 구조다. 문제는 검사비가 수백만 원이라 기증 희망자가 선뜻 내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점이다. 장기기증본부가 신청자를 받아 검사비를 지원하지만 한계가 있다.
국립혈액장기조직관리원 최신 통계에 따르면 순수기증은 법 개정 전 수십명이었지만 2017년 7명, 2018년 3명, 2019년 1명으로 줄더니 2020년 0명으로 줄었다.
장기기증 등록 업무를 맡은 의료기관이 기증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금복 장기기증본부 대외협력국장은 "신장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들이 매년 2000여명씩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전문기관을 설립해 순수기증 희망자들을 상담하고 기증 절차 안내, 기증 후 건강 관리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