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오전, 서울 송파구 모 아파트 단지 내 '투명방음벽' 아래에 죽어 있던 박새. 유리창에 부딪혀 죽은 걸로 추정되었다./사진=남형도 기자
17일 오전, 서울 송파구 모 아파트 단지 내 '투명방음벽' 아래에 죽어 있던 박새. 유리창에 부딪혀 죽은 걸로 추정되었다./사진=남형도 기자아파트 가장자리쪽으로 향했다. 끝에 다다랐다. 거기엔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설치된, 높고 투명한 '유리 방음벽'이 우뚝 서 있었다. 그 너머는 차도였다.
유리 방음벽 코 앞까지 들어가봤다. 수풀을 헤치고 잔디밭 안쪽, 마른 땅으로. 바로 아래까지 도착했다.
 박새가 죽어 있는 위치는 투명방음벽 바로 아래쪽이었다./사진=남형도 기자
박새가 죽어 있는 위치는 투명방음벽 바로 아래쪽이었다./사진=남형도 기자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자그마한 박새의 사체였다. 손바닥만큼 작았고, 꽁지가 길었고, 회색과 흰색 털이 섞여 있었다. 마른 낙엽 사이에 고개를 박은 듯한 자세로, 그대로 죽어 있었다.
 명복을 빌며, 죽은 박새 위에 마른 낙엽을 이불처럼 덮어주었다./사진=남형도 기자
명복을 빌며, 죽은 박새 위에 마른 낙엽을 이불처럼 덮어주었다./사진=남형도 기자가만히 눈을 감았다. 평소 잘 찾지도 않는 신에게 기도했다. 명복을 빌었다. 아무 장벽 없는 세상에서 훨훨 날게 해달라고.
1㎞ 길이의 아파트 '유리 방음벽'…새들 지속적으로 부딪혀 죽어
 서울 송파구 모 아파트에 높다랗게 세워진 투명방음벽. 새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부딪혀, '무덤'이 되는 경우가 많다./사진=남형도 기자
서울 송파구 모 아파트에 높다랗게 세워진 투명방음벽. 새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부딪혀, '무덤'이 되는 경우가 많다./사진=남형도 기자이 시각 인기 뉴스
"투명 방음벽으로 인해 많은 새들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관리실, 입주자대표회의에 건의했지만, 모르쇠로 일관 중입니다."
ㄱ씨는 이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었다. 새들이 유리창에 부딪혀 허망하게 죽는 걸, 차마 모른척하지 못했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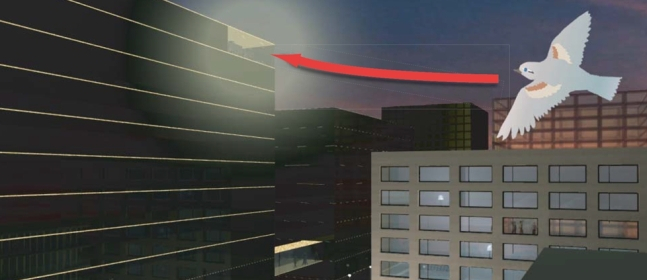 새들이 비행하다가 유리창에 충돌하는 이유는 투명성, 반사성, 야간 조명 때문이다./사진=녹색연합
새들이 비행하다가 유리창에 충돌하는 이유는 투명성, 반사성, 야간 조명 때문이다./사진=녹색연합 서울 송파구 모 아파트 방음벽 아래에 죽어 있는 새./사진=ㄱ모 독자 제공
서울 송파구 모 아파트 방음벽 아래에 죽어 있는 새./사진=ㄱ모 독자 제공아파트 안쪽으론 나무가 많아, 새들이 그 사이를 자주 날아다녔다. 반사된 유리창이 나무처럼 보이기도 했다. 주변은 새들이 머물기 좋은 식생이 워낙 많았다. 작은 새들, 까치, 비둘기 등이 자주 보였다. 방음벽 근처에 오려 할 때마다 부딪힐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서울 송파구 모 아파트 방음벽 아래에 죽어 있는 새./사진=ㄱ모 독자 제공
서울 송파구 모 아파트 방음벽 아래에 죽어 있는 새./사진=ㄱ모 독자 제공'충돌 방지 스티커' 있지만, 전체 70% 민간 건축물에 적용 어려워
 유리창에 부딪혀 죽은 새의 흔적./사진=녹색연합
유리창에 부딪혀 죽은 새의 흔적./사진=녹색연합 유리창에 충돌해 죽은 새들을 기록하는 '네이처링' 플랫폼./사진=네이처링
유리창에 충돌해 죽은 새들을 기록하는 '네이처링' 플랫폼./사진=네이처링 새 충돌 방지 스티커를 붙이는 녹색연합 활동가들. 작은 점들 덕분에 통과할 공간이 없단 걸 인식하게 되고, 새들이 죽음을 피할 수 있게 된다./사진=녹색연합
새 충돌 방지 스티커를 붙이는 녹색연합 활동가들. 작은 점들 덕분에 통과할 공간이 없단 걸 인식하게 되고, 새들이 죽음을 피할 수 있게 된다./사진=녹색연합녹색연합 활동가들과 '새 친구'라 불리는 시민들은, 2019년 봄부터 현재까지 투명 유리창, 방음벽 등에 스티커를 계속 붙이고 있다.
지난 6월 11일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됐다. 공공기관이 새충돌을 줄일 수 있게 관리하도록 법이 바뀐 거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 자치구는 저감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녹색연합이 지난 6월 서울 25개 구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새 충돌 저감 조치를 시행한 건 구로, 금천, 노원구 세 곳뿐이었다. 처벌 조항도 없어서다.
 국도변 투명방음벽 아래에 죽어 있는 새./사진=녹색연합
국도변 투명방음벽 아래에 죽어 있는 새./사진=녹색연합유새미 녹색연합 활동가는 "아파트면 민간 건물이고 강제 사항이 아니라서, 건축법을 바꾸는 것 말고는 사실상 방법이 없다"고 했다. 민간 단위로 적용되는 건 아직 어렵단 얘기였다. 비용도 만만찮다. 유 활동가는 "재작년에 용인 아파트를 모니터링하고 새 충돌방지 스티커를 붙이려했더니 1000만원이 넘게 들더라"라고 했다.
다만 희망적인 건 인식도, 제도도, 빠르게 변하고 있단 것. 유 활동가는 "우리나라가 (새 충돌 문제에 대해) 문제 인식 갖게 된 건 얼마 안 됐지만, 변화가 빠르다고 보고 있다"며 공공기관부터 저감조치를 정착시켜, 차츰 민간까지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