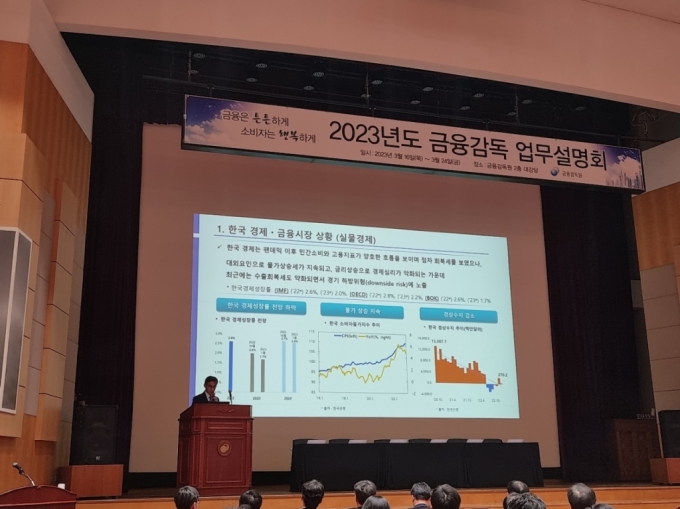 김준환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소재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은행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이용안 기자
김준환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소재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은행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이용안 기자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은행의 유동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자체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모형을 만들기로 했다. 금감원은 은행 자본 적정성을 평가하는 자체 테스트 모형은 갖고 있지만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모형은 없다.
스트레스테스트란 외부 충격에 대한 은행의 위기 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수단이다. 과거에는 국제결제은행(BIS)비율 등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자본 부문의 테스트가 주로 이뤄졌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엔 현금흐름 등 유동성 위기에 대한 테스트도 활발해졌다.
은행권은 그간 금감원이 유동성 위기 시나리오를 제시하면 개별 은행들이 각사별 상황을 고려해 만든 모형을 통해 매분기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해왔다. 은행별로 처한 상황이 다른 만큼 각 은행의 유동성 테스트 모형도 제각각이었다.
금감원은 앞으로는 은행권의 자체 모형과 함께 새롭게 만드는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모형을 통해 다각도로 유동성 리스크를 측정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의 테스트 모형을 통해 나온 결과와 금감원의 테스트 결과를 비교해 통합적으로 유동성을 관리할 것"이라며 "감독원의 모형이 조금 더 넓은 시각을 반영할 수 있는 만큼 두 결과 간 접점을 찾는 방식으로 지금보다 더 세밀한 유동성 관리가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 15일 '제3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를 도입해 유동성 관리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스트레스테스트 후 금융당국이 은행들에 추가 자본 확충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테스트 결과가 미흡해도 금융당국이 개별 은행에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등 직접적인 감독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