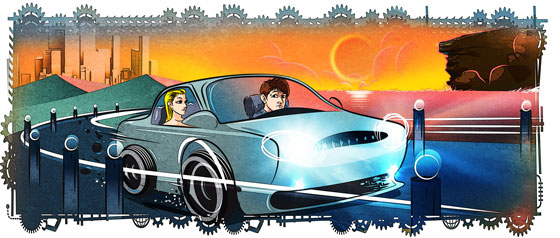 일러스트=임종철 디자이너
일러스트=임종철 디자이너마이클은 인공지능을 개조한 혐의로 그 자리에서 체포됐다. 제타는 여자를 뒷좌석에 태우고 폐기장으로 향했다. 평소라면 트렁크에 태웠겠지만, 이번엔 왠지 그러고 싶지 않았다.
"괜찮겠소?"
"폐기장에 연락해서 에스코트를 요청하겠습니다. 별일이야 있겠습니까?"
"노래 제목이 뭐죠?"
입을 다문 채 창밖을 바라보던 여자가 제타에게 말을 걸었다. 제타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돌려 여자를 바라봤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이봐, 질문은 금지야."
여자는 제타와 눈을 마주치더니 빙긋 웃었다.
"비니스트, '해가 물에 잠길 때'. 이미 알고 있어요."
"알면서 왜 물어보는 거야?"
제타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비니스트는 제타처럼 수몰 지구 출신이다. 필리핀에서 커피 농사를 짓던 비니스트의 보컬 '아멜'은 난민이 되어 이곳저곳을 떠돌다 마침내 미국에 정착해 가수가 됐다. 비니스트라는 이름은 커피콩(bean)에서 따온 이름이다.
"궁금하니까요, 당신의 반응이. 나도 이 음악이 좋아요. 내 이름은 프레야에요. 당신은요?"
룸미러를 통해 본 여자는 제타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로 제타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역시 인공지능은 귀찮아, 라고 제타는 생각했다. 차는 어느새 인공 숲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었다. 아직 한낮인데도 하늘이 어두웠다. 숲 너머로 펼쳐진 서쪽 바다 위에는 희미하게 햇빛이 드리웠다.
"제타, 내 이름은 제타야."
인공 숲만 지나면 폐기장으로 가는 다리가 나올 테고, 그 사이 인공지능에 정을 붙일 가능성은 영에 가까웠다. 단지 데이트를 하는 기분이 들어 마음이 조금 들떴을 뿐이다. 이름 따위 알려준다고 해서 문제가 생길 리 없다.
"살려달라느니 집으로 돌려 보내달라느니 하는 말은 하지 마. 너한테 동정심 따윈 조금도 없으니까."
제타의 단호한 태도에도 프레야는 미소를 잃지 않았다.
"정말 인간다운 생각이네요. 내가 살아서 뭐하려고요? 지구를 지배하는 악당이라도 될까봐?"
제타는 프레야의 반응에 당황했다. 마지막으로 자아정체성을 가졌던 인공지능은 21세기 말에 사라졌다. 그 당시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던 제타는 스스로 사고하는 인공지능이 처음이었기에 이런 대화가 낯설었다. 이미 사춘기를 훨씬 지나친 게 분명했다. 매뉴얼대로라면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프레야를 사살해야 했다. 휴대용 방전기를 찾으려고 수납장을 열었다가 얼마 전에 트렁크로 옮겨 두었다는 생각이 뒤늦게 났다. 혹시나 트렁크에 가둔 피코가 난동을 피우면 손에 잡히는 곳에 방전기를 두는 편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피코를 트렁크가 아닌 뒷좌석에 태울 일이 생길 줄은 미처 몰랐다.
"젠장."
제타가 차를 세우고 문을 열려는데 프레야가 깔깔대며 말했다.
"걱정 말아요. 아무 일도 없을 테니까. 가는 동안 내가 인간들을 학살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못할 것도 없지만."
프레야는 매력적인 비음을 내며 웃었다. 제타는 잠시나마 가졌던 경계심이 누그러지는 걸 느꼈다. 아주 조금이지만 호감마저 생겼다.
"대신, 잠깐 돌아가는 건 어때요? 해안선을 따라서 돌아도 좋고, 다른 동네에 가보는 것도 좋아요. 마이클의 집에 너무 오래 갇혀 있었거든요."
이어지는 프레야의 제안에는 잠시 망설였다. 만약 제때 폐기장에 가지 않는다면, 그 즉시 경찰들이 출동할 터였다.
"그건 좀 곤란하겠는데. 경찰이 우리를 잡으러 올 거야. 난 직장에서 잘릴 테고."
프레야는 개의치 않는다는 듯이 대답했다.
"지금 인류가 멸망하는 것보단 낫지 않겠어요?"
제타는 그 말에 호탕한 웃음을 터뜨렸다. 이번 직장은 다른 곳보다 벌이가 좋았는데 아무래도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았다. 아무렴, 저렇게 아름다운 여자와 드라이브를 한 적이 언제였던가. 모르긴 몰라도 그에게 이런 기회가 다시 오진 않을 것이었다. 아주 잠깐이다, 제타는 스스로 합리화했다. 자동운전 모드를 해제하고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인공 숲 위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차를 돌리고 채 오 분도 안 되어 폐기장에서 연락이 왔다.
"이봐,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적색 단계 피코를 데리고 시간을 끌면 곤란하다고."
GPS에 이상이 감지된 걸 확인한 공무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PDA를 통해 전해졌다.
"미안합니다, 현장에 코드 리더기를 두고 왔어요. 젠장, 출입 카드도 두고 온 것 같군요. 내가 요새 이렇다니까요.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제타는 생각나는 대로 변명을 둘러댔다. PDA를 옆 좌석에 내려놓은 탓에 얼굴이 보이진 않았지만, 제타를 질타하는 목소리에서 잔뜩 일그러진 공무원의 표정이 느껴졌다. 전화가 끊어지자마자 프레야가 제타를 돕겠다고 나섰다.
"거짓말을 퍽 잘하시네요. 내가 GPS를 조작해 둘게요. 가려던 대로 가주세요."
"그런 게 가능해?"
제타가 룸미러를 통해 프레야와 눈을 마주쳤다.
"일도 아니죠."
프레야는 윙크를 보냈다.
차는 인공 숲을 벗어나 해안도로 방향으로 꺾었다. B구역과는 반대 방향이었다. 그러나 내비게이션은 차가 여전히 B구역으로 향하고 있다고 지도에 표시했다.
해안 도로를 달리는 데는 십 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도로는 거대한 주상절리를 끝으로, 도심 방향으로 이어졌다. 시립 도서관과 시청, 그리고 회사 건물들이 즐비한 번화가였다. 제타는 프레야에게 도시를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혹시 시내에 가봤나? 크진 않지만 있을 건 다 있지."
프레야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무언가 곰곰이 생각하는 눈치였다.
"당신은 어디로 가고 싶은데요? 당신이 가고 싶다면 가도 좋고요."
답변이 모호했다. 제타는 프레야가 당최 무얼 하자는 건지 종잡을 수 없었다.
"혹시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니겠지? 지금 당장 핸들을 돌려서 폐기장으로 향할 수도 있어."
문득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생각해 보니 오랫동안 갇혀 있어 답답했다는 말도 믿을 수가 없었다. 인공지능이라면 언제든 인터넷에 접속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제타 자신처럼 VR 체험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심지어 비니스트의 음악도 알고 있지 않은가. 제타는 프레야의 외모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생각하고 다시 정신을 차렸다. 지금이라도 돌아가야 했다.
"결정했어. 당장 돌아가겠어. 이게 뭐하는 짓인지, 원."
"잠깐, 방법을 찾았어요. 혹시 인공지능 연구소로 갈 수 있어요?"
프레야가 다급하게 제타를 막았다.
"아니, 당장 폐기장으로 갈 거야. 고작 피코 하나 때문에 소중한 직장을 잃을 순 없어. 내가 너를 데리고 돌아다녔단 게 들통 나면 직장을 잃은 걸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당장 수중감옥에 끌려갈 수도 있어!"
"잠시면 돼요. 당신을 도울 방법이 생각났다고요!"
프레야의 외침에 제타는 할 말을 잃었다.
"날 돕는다고? 도대체 뭘? 아니, 왜?"
"그게 내 정체성이니까요." <☞ 4회로 계속, 9일에 이어집니다>
*제목은 연재를 위해 편의상 붙인 것으로 원작품엔 부제가 없음을 밝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