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기사는 04월17일(16:25) 머니투데이가 만든 프로페셔널 정보 서비스 'thebell'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
우리은행과 예금보험공사가 서브프라임 관련 투자의 손실책임을 두고 미묘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종합금융단으로 시작한 IB사업부가 2002년부터 올린 총 수익은 1조원을 훌쩍 넘는다는 게 우리은행 측 설명이다.
자연스레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관련 투자비중이 높던 우리은행이 집중적인 질타 대상이 됐다. 남들이 안하는 투자에 과감하게 나서면서 부러움을 사던 우리은행의 투자전략이 한순간에 징계 대상으로 전락한 셈이다.
예보측 주장은 다르다. 우리은행 IB본부 손익에 대해 예보는 2006년 1843억원, 2007년 2461억원 등이라고 밝혔다. 또 2007년의 경우 CDO 상각분을 감안하면 손실이 2086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양측 주장이 다른 이유는 수익을 계산하는 방식이 회계방법에 따라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의 경우 이연상각 방식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계정에 올리는 수익이 달라진다.
손익논란과 함께 CDO투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 책임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슈는 은행과 감독당국 모두 예상하지 못했다"며 "다른 은행들의 손실이 적었던 건 파생상품 투자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지 리스크 관리가 정교했기 때문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예보 관계자는 "그동안 우리은행의 자산확대에 지속적인 경고를 해왔다"며 "(우리은행에 대한) 징계대상과 수위는 예보위에서 결정할 사안이지만 공적자금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막대한 투자손실을 낸 데 대해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양측의 엇갈리는 견해를 떠나 글로벌 IB들과 비교해 우리은행의 투자 포트폴리오가 무리한 것만은 아니었다는 분석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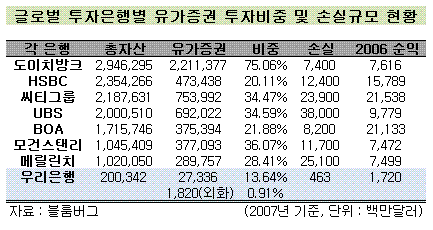
이에 비해 우리은행의 총자산 대비 유가증권 투자비율은 13.64%로, 이 중 국공채나 외평채 등 안전자산에 속하는 국내채권투자를 제외하면 외화채권 투자비율은 1%에도 못미친다. 이 중 절반이 안되는 서브프라임 관련 투자가 예상보다 커다란 파장을 일으킨 것이다.
관계자들은 지난해 말 관련 투자액(4억9000만 달러)의 90% 가량인 4억4100만 달러를 감액손으로 처리, 회계상 투자액 대부분을 상각했다. 손실을 미리 제하고 다시 심기일전, 사업에 집중하면 만회가 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외국계 IB 관계자는 "투자은행은 손실이 나면 규정위반이나 도덕적 해이를 검토하고 문제가 없다면 만회할 기회를 준다"며 "높은 위험을 예상하고 투자하는 업무 특성을 고려해야 IB가 발전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예보 관계자는 "우리은행을 제외한 다른 시중 은행들은 CDO 투자손실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며 "미국의 투자은행의 손실과 우리은행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