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부동산 시장침체에도 주택은 계속 공급되어야
머니투데이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2022.10.19 02: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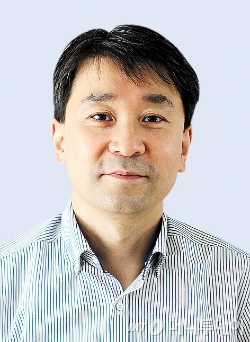 마강래 중앙대 교수
마강래 중앙대 교수 지금으로부터 딱 4개월 전 일이다. 한 신문사로부터 인터뷰 요청 전화가 왔다. 생애 첫 주택구매를 위한 정부의 대출규제 완화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이었다. 집값에 거품이 잔뜩 끼고 금리가 올라가는 것만 남았는데 당분간 대출규제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기자는 지금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데 규제완화에 반대하는 이는 처음이라며 놀라워했다. 그러면서 다른 전문가들은 청년들을 위한 '주거사다리'를 지원하는 대책이 늦어진 점을 아쉬워했다고 전했다. 필자는 그건 주거사다리가 아니라 '썩은 동아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에 낀 거품을 측정하는 지표 중 내가 가장 신뢰하는 것은 '주택구입부담지수'(HAI)다. 이 지표는 대출금리에 대한 가계의 부담을 민감하게 반영한다. 한 해 4000만원을 버는 가구의 예를 들어보자. HAI는 집을 위한 '적정부담액' 수준을 가구소득의 25% 정도로 보는데 이때 HAI를 100으로 설정한다. HAI가 가장 높았던 때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2/4분기다. 당시 서울의 HAI는 164.8이었다. 신문사 인터뷰 당시 서울 HAI는 200을 넘었다. 원리금 상환을 위해 소득의 50%인 가구당 2000만원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금리가 높아지면 이자부담이 커지기도 하지만 집값도 내려간다. 금리인상이 항상 집값하락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틀린 말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금리와 집값은 꼭 반비례하지만은 않았다. 집값이 상승할 때 금리를 올리면 금리와 집값이 함께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이런 경우는 경기가 좋아지는 국면에서 자주 발생한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다르다. 경기침체 국면에서 금리를 올리면 부동산 시장은 침체할 수밖에 없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자 일부 전문가는 공급을 줄여야 한다는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다. 공급을 늘리면 집값이 더욱 폭락할 것이란 논리다. 참으로 답답한 얘기다. 우리나라의 집값은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며 반세기 동안 꾸준히 상승했다. 그래프로 보면 지속적인 우상향 추세다. 집값이 오르면 공급을 급속히 확대하고 내리면 공급을 줄이는 정부의 정책이 부동산 시장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주택공급은 적어도 4~5년의 기간이 필요한데 공급이 본격화할 때 부동산 시장은 이미 예전과 다른 상황으로 변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정책에선 공급과 수요 모두 중요하다. 하지만 공급보다 '수요를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수도권으로만 인구와 일자리가 쏠리는 상황에서는 수도권의 집값은 '장기적으로' 더욱 가파르게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한 '밀도관리'를 해야 한다. 이게 근본적인 수요관리 정책이다. 그럼 공급정책은 어떠해야 할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하는 2019년 기준 우리나라 1000인당 주택 수는 411가구다. OECD 평균인 462가구보다 크게 낮다. 최저주거기준에 해당하는 가구는 100만가구, 노후화해 멸실 직전에 있는 주택 35만가구, 옥탑방이나 반지하 10만가구를 고려하면 실제 우리나라는 주택이 너무나 부족하다.
주택공급의 기준은 부동산 시장 상황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력에 맞는 주택의 '질'과 '양'이다. 이 둘이 수준 이하라면 정부는 우직하게 공급을 이어나가야 한다. 출렁이는 집값의 등락에 일희일비하며 공급량을 조절하면 부동산 시장만 교란될 뿐이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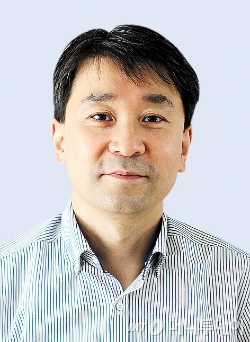 마강래 중앙대 교수
마강래 중앙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