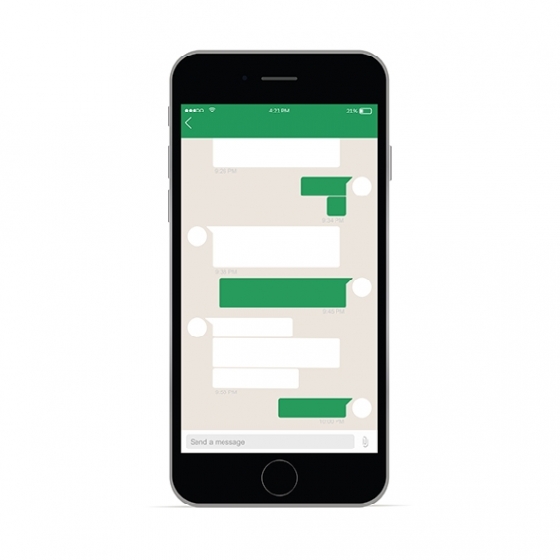
“캠퍼스 커플만은 절대 하지 마.” 대학 기숙사에 들어간 첫날, 룸메이트가 된 선배가 치킨을 사주며 해준 첫 충고였다. 당시에는 그가 하는 말의 의미를 잘 몰랐다. 스무 살, 분홍 꽃잎이 휘날리던 봄이었고 다들 연애를 해야 ‘위너’라 말하니 괜히 마음에 없던 봄바람도 불었다. 얼마 되지 않아 결국 나는 첫 남자친구를 만났다. 그리고 연애가 무엇인지를 배우기 시작했다. ‘사랑하니까’ 밥을 같이 먹는다. 영화를 본다. 손을 잡는다. 입을 맞춘다. 만진다... 잠깐. 선택의 순간이 찾아온다. 사랑하니까 자고 싶다는 그의 말에 응할 것인가, 아니면 나를 지킬 것인가.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당시 본능적으로 느꼈던 생존 감각에 대한 표현이다. 또한 남자친구가 처음 나를 만나며 했던 약속이기도 했다.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그는 언젠가부터 조급해졌다. 밖에서 보는 대신 자취방으로 나를 부르는 횟수가 늘어갔다. 숙소를 찾아보며 여행을 가자고 졸랐다. 그러나 수많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그의 의도대로 풀리지 않았다. 미안하다며 우는 내 앞에서 급기야 그는 말했다. “다들 나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나보고 고자래.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 알아?” 남자들의 대화에서 내가 어떻게 오르내리고 있을지 눈에 선했다. 헤어지기 직전 그는 내게 말했다. “이럴 줄 알고 너랑 자려고 했던 거야, 이 이기적인 년아.” 그때 내가 그에게서 배운, 혹은 배웠다고 생각했던 사랑의 의미는 형편없이 짓밟혔다. 마치 그와 함께 구경했던 벚꽃들이 바닥으로 떨어져 맞던 최후처럼. 그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정말 사랑했다 해도 내게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다. 그에게 나는 단지 욕구를 충족시킬 성기에 불과했던 모양이다. 그때 깨달았다. 여성의 몸에 대한 폭력은 항상 친밀함, 이성적 호감, 혹은 사랑의 형태로 다가온다는 것을.
그래서였을까. 지금까지 만난 남자친구들은 한결같이 남자들로만 구성된 단체 카톡방을 보여주지 않으려 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남자끼리의 대화’라서, 혹은 ‘낯부끄러운 것들’이 있어서. 무슨 이야기가 오갈지는 충분히 예상이 갔다. 차라리 모르는 척하고 싶었지만, 가끔 드러나는 내용도 있었다. “야, 너 고등학교 때 이런 상도 받았더라?” 비교적 친하게 지내던 남자 동기가 한 말이었다. 말한 적도 없는정보를 어떻게 알았냐는 추궁에 그는 당황스러워했다. “화내지 말고 들어.” 그는 남자 동기들이 몇몇 여자 동기들의 정보를 인터넷에 치며 ‘구글링’을 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심지어 그중 성형이 의심되는 몇몇의 사진은 단체 카톡방에서 돌아다니기까지 했단다. “아는 체하면 그 애들이 상처받을 거 같다”라며 비밀로 해달라는 그에게 반문하고 싶었다. 그러니까, 애초에 떳떳하지 못할 일을 대체 왜 숨기면서까지 하는데?
수없이 고민했다. 대학을 벗어나면 달라질까. 직장을 옮기면 달라질까. 아니었다. 첫 직장에서 만난 동료는 내 눈동자에 대해 “괜히 사람을 야릇하게 한다”라고 말했다. 이후부터 나는 그의 눈을 쳐다보지 않고 업무에 대한 대화를 나눠야 했다. 나이 지긋한 팀장은 내게 말했다. “너는 왜 그렇게 엉덩이가 부각되는 옷을 입니? 사람 불편하게.” 나는 그날 검정 슬랙스 바지를 입었다. 슬랙스 바지가 불편하다면 대체 나는 무엇을 입어야 하는지? 남자들만 모인 회사 동기들의 단톡방에서는 가장 잠자리를 하고 싶은 여자 사원에 대한 투표가 이뤄졌다. 그들은 이런 일들이 그저 '호감'의 표현이자, 이성애자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성적 긴장감이라 여겼다. 어디를 가든 내가 여자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았고, 여자를 향한 세상의 시선도 바뀌지 않았다. 내 삶은 ‘단톡방’에서 벗어났던 적이 없다. 단순히 ‘모바일 플랫폼의 단체 대화방’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의 여자가 경험하는 삶이다. 어디를 가든 눈동자, 엉덩이, 외모, 혹은 나의 일부일 뿐인 몇몇 특징이 나를 대표하는 삶. 내가 모르는 사이 나에 대한 품평이나 내 신체의 일부를 촬영한 사진이 떠돌아 다닐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시달리는 삶. 슬프게도 지금 내게는 그런 현실에 ‘나가기’를 누를 권리가 없다.
누군가는 내게 변했다고 말한다. 이전의 나는 행복해 보였고, 훨씬 더 순했고, 지금처럼 분노하지 않았다고 한다. 할 수 있다면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처음부터 이렇지는 않았다. 두려움 없이 사랑의 의도를 순수하게 여겼단 적도 있다. 그리고 나 역시도 분노할 시간에 이전처럼 일상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고, 인간을 신뢰하고 싶다. 그러나 그 이전에 성기나 엉덩이, 얼굴, 혹은 동영상으로 파편화된 내가 떠돌아 다닌다는 공포에서 벗어나 온전한 사람으로 존중받고 싶다. 여전히 사람들은 단톡방을 만든 가해자가 아니라 그 안에 갇힌 여자가 누군지를 궁금해한다. 그 여자가 어느 정도의 치부를 드러내고 비참해질지를 관음하려 한다. 그리고 온갖 말들로 화살표를 그에게 돌리고 싶어한다. 이렇게 변하지 않는 현실에서 내가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문득 ‘지켜주겠다’고 말했던 누군가의 약속이 떠오른다. 돌이켜보니, 정말 필요했던 건 나를 지켜주겠다 말하는 남성의 달콤한 약속이 아니었다. 애초부터 여성이 누군가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없는 세상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