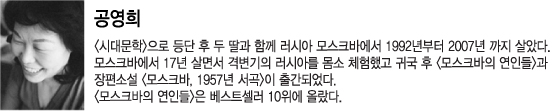얼마 전, 필자는 두 딸과 함께 러시아의 극동 블라디보스톡을 다녀왔다. 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에서 두 딸에게 연주를 의뢰해 왔기 때문이다. 러시아에서 17년을 살았지만 블라디보스톡은 한 번도 가 본적이 없어 흥미로 왔다.
블라디보스톡을 떠나는 날, 다행히 러시아 비행기는 12시 40분 출발이어서 새벽부터 일어나는 부산을 떨지는 않았으나 그래도 아침 7시부터는 준비하고 8시에 집을 나섰다. 공항에서 이리저리 바삐 움직이고 수속하고 나자 배고픔이 일시에 달려왔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국적기는 일본이나 중국을 경유해서 2시간 반이 걸리는데 러시아비행기는 북한을 경유해 단시간에 도착한다고 했다. 우리는 탁월한 선택?에 즐거워하며 공항에 내렸는데 러시아 공항에 내리면 언제든지 어둠침침하고 강압적인 공항 직원들 태도에 짜증이 나곤 했는데 블라디 공항은 아주 편안한 공기와 기운이 감돌았다.
외국을 다니다 보면 공항에 딱 내렸을 때 그 나라의 기운을 받는 것 같았다. 센 나라는 세게, 조그만 나라는 부드럽고 편안하게, 아무튼 그런 에너지를 받는 것은 확실했다. 그런데 블라디의 공기는 느긋하고 한가로 왔다. 출국 절차도 그리 까다롭지 않아 전체적으로 중국 연변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 시각 인기 뉴스
블라디보스톡 공항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길을 따라 깊고 넓은 바다가 있었다. 그 날은 바람이 심하게 불었고 바다의 파도는 크게 출렁거렸는데 햇빛에 눈이 부셔 선글라스를 쓰지 않으면 똑바로 바라볼 수 없을 정도였다.
바다는 끝이 없었다. 필자는 차 안에서 구 한말 시대의 동포들이 어른거렸다. 조선에서 먹고 살 길이 없어 저 넓은 바다를 건너 물설고 낯설은 러시아 땅 연해주로 넘어온 사람들, 그들의 토양이 바로 이곳이었다니, 블라디가 다시 보였다.
다행히 러시아인들에게 근면함을 인정받아 넓은 땅을 분양받아 열심히 살아가던 조선인들, 그러다가 1937년 스탈린의 남하정책으로 솥단지와 냄비, 이불 한 채만 들고 이름도 모르는 녹슨 기차를 타고 달려야 했던 조선인들, 눈물이 바다로 오버랩 되고 있었다. 40여일을 달려 타쉬켄트로 갈 때까지 본인들은 어디로 가는지, 살아야 하는지 죽어야 하는지 조차 몰랐다는 내 민족들, 기차 안에서 죽어가고 타쉬켄트에서 죽어갔던 수많은 동포들의 원한이 햇빛이 눈부시게 눈을 쏘아대듯 머리를 쪼아댔다.
필자의 두 딸은 블라디보스톡에 도착한 다음 날, 시내에서 한.러 수교 24주년 및 한.러 상호방문의 해 기념 연주를 하고 다음 날은 고려인들이 많이 산다는 “아르쫌 시(市 ) 문화예술회관에서도 연주를 했다.
블라디보스톡 문화수준은 모스크바 시와는 완연히 달랐다. 필자와 두 딸은 같은 러시아의 다른 수준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어느 나라나 수도와 지방도시는 다르니까. 그러나 정말 놀란 것은 “아르쫌 시”에서 였다. 고려인이 많이 사는 지역이라 총영사님은 특별히 고려인을 배려해 시장과 부시장에게 부탁해 가장 큰 연주 홀에서 연주회를 마련한 것이었다.
정작 연주가 시작되자 좌석을 채운 것은 전부, 러시아인들이었다. 그들 또한 이렇게 좋은 클래식 연주는 자기네 시에서 처음 가져 본다고 뜨겁게 흥분을 하고 필자까지 무대로 불러 내 인사를 시켰다. 리셉션 때도 부시장이 감사장을 주고 시의 간부들이 다가와 악수를 청하고 칭찬에 칭찬을 더했다. 그곳에 고려인은 연주회에 관련된 두 명만 있었다. 연주자들이 시 간부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필자의 마음은 씁쓸했다. 그리고 같은 민족이라고 사랑으로 감싸고 어떻게든 그들에게 힘이 되려고 애쓰는 총영사님의 노력에 감동을 받았다.
블라디보스톡, 아르쫌 시에 살고 있다는 고려인들은 어디에 있었던가, 자기들의 파티에 자신들은 빠지고 러시아 인들만 축제를 즐기는 모습에 검푸른 바다에서 파고가 높이 치솟는 것을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