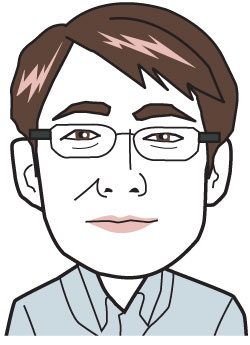 /그림=김현정 디자이너
/그림=김현정 디자이너"만약 지금과 같은 멘토링 시스템이나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창업 관련 교육 등을 활용할 수 있었다면 그 많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모든 게 부족했던 벤처 1세대의 시대는 그렇게 가고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이제 2세대 벤처 창업 시대가 열리고 있다.
하지만 많은 벤처들이 창업 후 4~5년차가 되면 이른바 '죽음의 계곡'을 맞는다. 지난해 중기청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나듯 벤처는 4~5년차 때 순이익이 가장 낮고 이 시기를 지나면 점차 수익이 오르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정책들이 벤처에 도움이 되고 있고 상황은 개선되고 있을까? 아직 섣부른 판단이지만 부정적인 생각을 떨칠 수 없는 현실이다.
지난해 감사원 점검결과를 보면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정책자금 공급기관이 실제로 '죽음의 계곡'에 빠져 고통 받는 벤처에 대한 지원은 줄이고 우량기업에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업력이 짧거나 담보력이 미약한 벤처기업이 재무 신용등급이 낮아 우수한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기술평가도 받아 보지 못한 채 보증을 거절당한 결과라고 지적한다. 벤처투자업계의 돈도 상장을 눈앞에 두거나 성장이 뚜렷한 업체로만 몰린다고 한다. 필요할 때 기댈 언덕이 없는 것이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스타트업이 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는 벤처 생태계가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투자사는 기술개발부터 마케팅까지 1회전 이상 지켜본 뒤 투자하고 단계별 소요자금도 챙겨준다. 벤처의 성공여부를 따지려면 투자시점으로부터 적어도 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다. 또한 핀란드는 정부 산하 기술혁신청을 둬 기업들에 투자했는데 기업 5천여 개(500명 이하 중소기업이 72%) 중 파산 업체는 1% 미만이다. 이러한 해외 사례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벤처 생태계를 만들어 내는지 몹시 궁금해진다. 과연 어떤 차이점이 벤처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발생시키는지 정말 제대로 알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
사실 현재 한국에서 2세대 벤처 창업 열기가 후끈 달아오르는 데는 미국 실리콘밸리를 비롯한 해외 선진 사례의 벤치마킹이 한몫 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쯤해서 지금까지 제대로 알지 못했던 해외 창업시스템을 더 깊게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독일 축구가 강한 이유는 특급 '선수' 육성이 아닌 특급 '시스템' 설립에 공들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선수들은 18부 리그까지 있는 독일 축구 시스템 하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쳐 나간다. 월드컵 영웅 클로제도 7부 리그 출신이다. 이런 문화가 '히든 챔피언'이 즐비한 독일을 만들어 낸다.
우리도 이제 창업문화를 생각해볼 때가 됐다. 많은 벤처들이 ‘죽음의 계곡’을 넘어 중견 기업으로 성장하고 독일의 히든 챔피언들처럼 국민 기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창업을 '대박을 쫓는 방편'으로 생각하는 문화부터 바꿔야 한다. 물론 글로벌 창업스타가 나오고 성공사례들이 많아져야 한다.
그렇지만 '대박' 아니면 '쪽박'이라는 식의 근시안적 창업 문화를 지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생활창업' 문화로 바꿔야 한다. 그래야만 창업교육이 초중고 학생들에게로 확장될 수 있고 삶의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다. 이런 가운데 히든 챔피언도 탄생하는 것이다. 창업이 '호환마마보다 더 무서운' 것이 아닌 '즐거운 창조'여야 한다.
이 맥락에서 우리에겐 '죽음의 계곡'을 벗어나기 위한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하다. 'M&A 활성화, 중간회수시장 활성화'도 좋은 방안이다. 무엇보다 벤처가 자력으로 성장 할 수 있고 실패하더라도 언제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의 시스템과 문화가 절실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