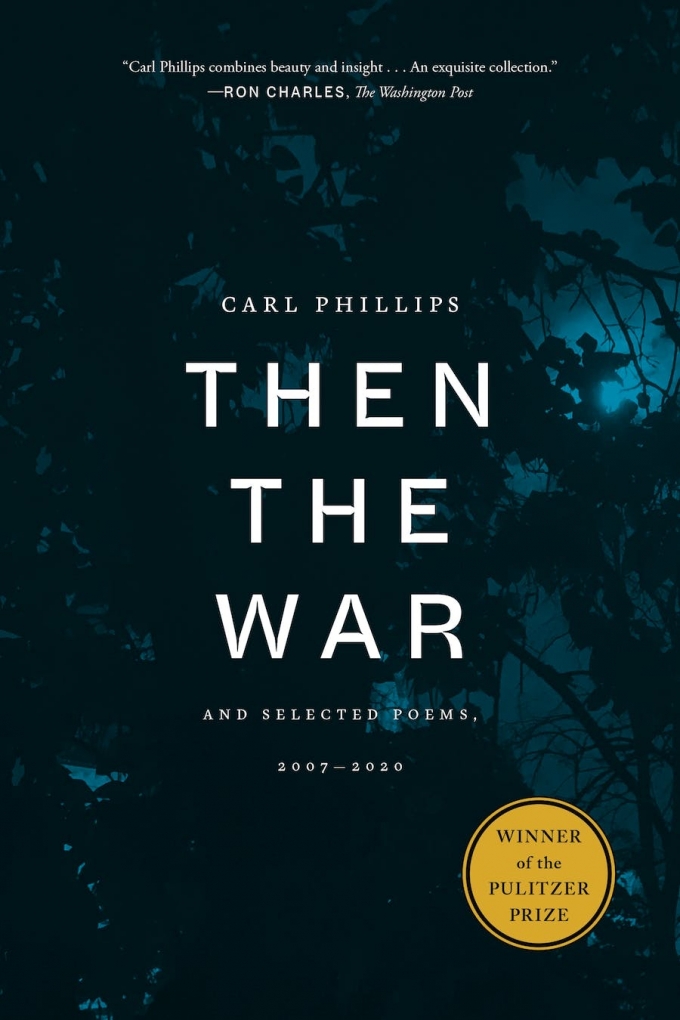 칼 필립스의 시집 '그러자 전쟁'의 표지. /사진제공=Farrar, Straus and Giroux
칼 필립스의 시집 '그러자 전쟁'의 표지. /사진제공=Farrar, Straus and Giroux칼 필립스 - 그러자 전쟁 (번역: 조희정)그들은 꽃을 심었다, 그 집에는 방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꺾어진 꽃들이 방마다 구두점을 찍는
삶을 상상해 왔기 때문에, 마치 각 방이 그저 장식되어야 할 뿐 아니라
가장 기억할 만한 문장들이―마치 사람들처럼―항상
살짝 저항하는 것... 바다로 삐져나온 땅, 구름 떼에서 나온
조각들. 그 와중에,
매의 둥지, 겨울 둥지, 믿음의 형태로서의 스태미나, 삶에
값하는 작은 만, 내 생각엔 그들이 영혼이라 불렀던 것을
바람이 닿을 수 없는 곳에 깊숙이
자리 잡은 석양.
그러자 전쟁.
그러자 광장, 그리고 그 곳을 가로질러
자신감 넘쳐 보이는 말들을 행진시키는 기마경찰들.
그러자 다음 날 아침의 안개, 그 속에서 거의 보이지 않는
관리인들, 그림자처럼, 그늘처럼,
그 광장을 손질해서 티 하나 없는 깔끔함으로 돌려보내고.
이 시각 인기 뉴스
그러자 불 꺼진 방으로부터 바다를 향해 밖으로
부풀어 오르는 커튼들.
그러자 머리카락 없는 이가
머리카락이 좀 있는 이를 어루만졌다. 그들은 눈을 감았다.
부드럽게라면, 얼마나 부드럽게인지는 말하기 어렵다.
그러자 전쟁은 계속 그들을 당황하게 하지 않았다, 전에는 혹시 그랬을지라도.
'그러자 전쟁'이라는 시의 제목이 전달하는 긴장감 서린 어감과는 사뭇 다르게, 이 시는 상당히 평화로운 어조로 시작된다. 두 사람은 "꽃을 심고" 그 꽃이 피어나면 꺾어다가 둘의 보금자리인 집의 여러 방을 예쁘게 장식하리라 꿈꾼다. 리모델링을 하고 인테리어에 신경을 쓰는 많은 이들의 노력이 그러하듯이, 이 두 사람이 집을 장식하는 행위는 단지 주변 환경의 미적인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욕구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방마다 꽃이 그득한 '집'은 마치 "구두점"이 확실하게 찍힌 "문장"처럼 그 자체의 어떤 "규율"을 지닌 완벽함을 상징한다. '행복이 가득한 집'과 같은 잡지에 실린 사진들이 건네는 메시지처럼, 아름답고 단정하게 꾸며진 두 사람의 '집'은 안정감 있는 관계와 그에서 나오는 잔잔한 일상의 소중함을 표상하는 것이다.
하지만 시인은 이렇게 꽃으로 "구두점"을 찍는 것이 꽤 괜찮은 문장에서든 인간사에서든 "살짝 저항"해야만 하는 행위라고 덧붙인다. 자족적이고 영속적인 행복 따위는 동화 속에서만 존재하는 환상에 불과할 뿐이고, 현실에 존재하는 '집', 그리고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란 마치 "바다로 삐져나온 땅"이나 "구름 떼에서 나온 조각들"처럼 안정된 경계의 틀을 넘어서서 언젠가 불쑥 드러나게 될 불안한 요소들을 어딘가에 지니고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두 사람은 이런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서로를 바라보며 둘 사이의 관계에 온 힘을 다해 열중한다. '집'은 "둥지"로서 둘의 "믿음"을 정력적으로 실행하는 공간이 되며, "삶"과 "영혼"을 모두 의미하는 더없이 소중한 곳으로 여겨지게 된다.
"그러자 전쟁". 시의 중반부에서 이 짤막한 어구와 함께 갑자기 이루어지는 전환은 두 사람의 '집' 바깥에 언제나 도사리고 있는 위협을 상기시킨다. 사실 매일 집 밖을 나설 때마다 많은 이들은 전쟁 같은 현실을 향해 나아간다. 그리고는 "기마경찰들"이 늘어선 광장에서 다각적인 억압과 통제에 시달리고 때로는 그 속에서 고통스럽게 몸살을 앓는다. 게다가, 더욱 견디기 어려운 것은 이런 현실과의 마찰이나 충돌이 대부분의 경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곧장 지워지고 만다는 사실이다. "안개" 속에서 잘 보이지도 않는 "관리인들"이 모든 것을 처리하여 깔끔한 모습으로 상황을 되돌리고 나면, 일상적인 분투의 흔적은 물론 아무리 끔찍한 붕괴나 참사의 현장조차도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말끔히 정리되고 만다. '집' 바깥에서의 싸움은 그래서 그 말할 수 없는 처절함에도 불구하고 웬만해서는 잘 드러나지 않으며, 고통을 당하는 당사자가 아니면 제대로 감각하지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시에서 이렇게 "전쟁"과도 같은 바깥에서의 삶을 그래도 살 만한 것으로 만들어 주는 힘은 두 사람 사이의 "어루만짐"에서 나온다. "머리카락 없는 이"가 "머리카락이 좀 있는 이"를 어루만진다는 표현은 동성애적 관계를 암시하는 듯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완전히 채워지지 않고 어딘가 비어 있는 채 부족한 두 사람의 결합을 상상하게 한다. 혼자서는 세상과 맞서기에 힘없고 나약한 존재들에 불과하지만, 두 사람을 이어 주는 "어루만짐"은 이들이 잠시나마 모든 것을 잊고 눈을 감을 수 있게 해 준다. 부드럽게 눈을 감는 그 순간이 황홀한 쾌락을 의미하든 잔잔한 평안을 의미하든, 중요한 것은 접촉과 교감을 통해 두 사람이 더 이상 바깥에서의 '전쟁' 때문에 당황하지 않을 수 있을 만큼, 딱 그만큼의 저력을 얻게 된다는 사실이다.
시의 제목인 '그러자 전쟁'이 말해 주듯이, '전쟁'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잠시 사라진 듯하다가도 언제든 예기치 않은 순간에 다시 찾아올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마침표를 찍고 느낌표를 붙여서 '집'을 완결적인 문장처럼 만들려고 노력한다 해도, 사적인 삶을 격동하는 외부로부터 완벽하게, 또 지속적으로 떼어놓을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이 시는 바깥에서 겪어야 할 '전쟁'을 하루하루 견디고 감당할 수 있는 원동력이 몸과 마음이 맞닿는 따뜻한 순간에서 나올 수 있다는 평범하지만 중요한 진실을 말해 준다. 접속이 결코 대체할 수 없는 접촉, 또 그것을 담아내는 '집'이 있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삶은 그래도 살아낼 만한 것이 될 수 있다. 물론, 이렇게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관계를 반드시 부부나 연인과 같은 정형적인 형태로만 제한할 필요는 없겠지만, 사랑하는 사이에서 오가는 자연스러운 교감은 지친 개인의 삶에 의미 있는 구원을 가져다주고 세상과 다시 맞설 용기를 낼 수 있게 할 만한 힘을 가진다. '집'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확보하는 것에 따르는 현실적 어려움이 그 속에서의 내밀한 관계 맺기를 시도하지 않는 경향과 맞물려 있는 우리 사회의 쓸쓸한 흐름 때문인지, 시인이 부르는 이 담백한 사랑 노래의 마지막 부분은 따스하면서도 무거운 울림을 오랫동안 마음에 남긴다.
칼 필립스는 시인으로 'Speak Low', 'Double Shadow', 'Silverchest', 'Reconnaissance', 'Wild Is the Wild', 'Pale Colors in a Tall Field', 'Then the War: And Selected Poems' 등의 시집을 냈고 2023년 퓰리처상을 비롯한 문학상을 다수 수상했다. 워싱턴대학교 세인트루이스 캠퍼스에서 문학을 가르친다.
조희정은 중앙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로 하버마스의 근대성 이론과 낭만주의 이후 현대까지의 대화시 전통을 연결한 논문으로 미시건주립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인간과 자연의 소통, 공동체 내에서의 소통, 독자와의 소통, 텍스트 사이의 소통 등 영미시에서 다양한 형태의 대화적 소통이 이루어지는 양상에 관심을 가지고 다수의 연구논문을 발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