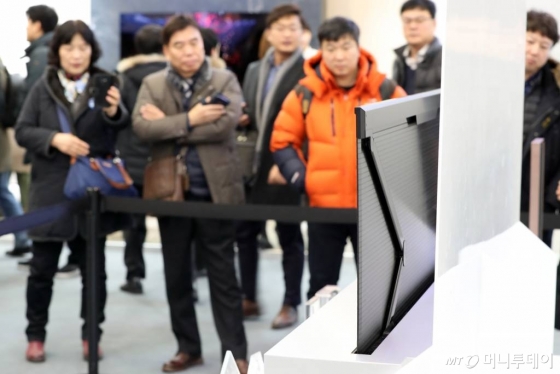 지난 1월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한국 전자IT산업융합 전시회' LG전자 부스에서 관람객들이 롤러블 TV를 관람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지난 1월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한국 전자IT산업융합 전시회' LG전자 부스에서 관람객들이 롤러블 TV를 관람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국내 최초의 TV는 브라운관 TV로 불리는 CRT TV였다. 1966년 금성사(현 LG전자 (91,100원 ▼1,500 -1.62%))가 출시했다. 금성사는 1960년대 초부터 개발에 착수, 1966년 8월1일 국내 최초의 흑백 CRT TV 'VD-191' 생산에 성공했다.
화면이 커질수록 TV 두께가 두꺼워지고 화질이 떨어진다는 점도 약점이다. '배불뚝이 TV'로 불렸던 이유다. 약점이 많았던 TV였지만 LCD(액정표시장치)와 PDP(플라즈마디스플레이패널)가 나오기까지 CRT TV는 한세기 이상 TV 시장의 주력으로 활동했다.
2000년대 들어 급성장한 LCD는 요새도 많이 쓰인다. 패널 뒤쪽의 백라이트(조명)에서 나온 빛이 액정을 통과해 각각 다른 패턴으로 굴절되면서 영상을 만든다.
이 시각 인기 뉴스
50~60㎝에 달하는 TV 두께를 10㎝도 안 되는 수준으로 줄인 LCD TV의 등장은 파격적이었다. 단숨에 시장을 장악했다.
 삼성전자 최초 컬러 TV. 모델명 'SW-C3761. /사진제공=삼성전자
삼성전자 최초 컬러 TV. 모델명 'SW-C3761. /사진제공=삼성전자LCD TV를 LED(발광다이오드) TV와 구분하는 경우도 있지만 큰 의미는 없다. LCD 패널의 뒤편에서 빛을 쏘는 백라이트가 냉음극 형광램프(CCFL)냐 LED냐의 차이일 뿐 패널 자체는 LCD로 같다. 굳이 정의한다면 LED 백라이트 LCD TV가 맞다.
10년 이상 풍미했던 LCD 시대는 이제 OLED 시대로 넘어가는 초입에 도착했다. OLED는 전기가 흐르면 유기물질이 스스로 빛을 내기 때문에 백라이트가 필요없다. 패널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LCD보다 TV가 더 얇아질 수 있게 된 셈이다. LG전자가 프리미엄 제품으로 판매하는 시그니처 TV의 경우 패널 자체가 너무 얇아 부서지지 않도록 덧댄 유리판까지 포함해 TV 두께가 3~4㎜에 불과하다.
반응속도도 LCD보다 1000배 이상 빠르다. 플라스틱 OLED는 자유롭게 휘거나 구부릴 수도 있다.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 시리즈의 '엣지 디스플레이'가 이런 성질을 활용한 것이다.
국내에서 OLED TV를 처음 선보인 곳은 삼성전자였다. 2012년 55인치 OLED TV를 공개해 세상을 깜짝 놀래켰다. 당시까지만 해도 TV 화면에 쓸만한 크기의 대형 OLED는 생산단가가 비싸 대량 제조가 쉽지 않았다. 유기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화면이 검게 그을리는 번인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삼성전자 역시 이 문제로 결국 출시 전에 사업을 접었다.
빈틈을 파고 든 것은 LG전자였다. LG전자는 2013년 OLED TV를 시장에 출시했다. 가격이 워낙 비싸 출시 이후 줄곧 시장 규모가 제자리걸음을 했지만 꾸준한 연구개발의 결과로 생산단가가 떨어지면서 지난해부터 시장성장세가 가파르다.
일본의 소니 등도 OLED TV를 프리미엄 제품으로 출시 중이다. 대형 OLED 패널은 전세계에서 LG디스플레이가 독점 생산한다. LG전자는 OLED를 상표화해 '올레드'라고 홍보 중이다.
올해 초 주목받았던 롤러블 TV 역시 OLED의 성질을 십분 발휘한 차세대 제품이다. TV를 보지 않을 땐 화면을 두루마리 화장지처럼 둘둘 말아뒀다가 TV를 켜면 화면이 펴지면서 영상을 보여주는 방식이다. LG전자는 올 하반기 롤러블 TV를 시장에 출시할 계획이다.
 삼성전자가 2018년 세계 최초로 마이크로LED(발광다이오드) 기술을 적용해 개발한 모듈러 TV '더월'. /사진제공=삼성전자
삼성전자가 2018년 세계 최초로 마이크로LED(발광다이오드) 기술을 적용해 개발한 모듈러 TV '더월'. /사진제공=삼성전자이 제품은 마이크로미터(㎛ㆍ100만분의 1미터) 단위의 LED를 회로기판에 촘촘히 배열한 TV다. OLED TV처럼 별도의 백라이트나 컬러필터 없이 색을 표현하는 데다 마이크로LED를 연결하는 만큼 패널 크기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한쪽 벽면을 TV로 가득 채우는 것도 가능하다. 무기물 기반이어서 OLED보다 내구성이 뛰어난 것도 장점이다.
국내 TV 가전업체의 양대산맥인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일본의 소니 등을 따라잡고 글로벌 선두자리를 꿰차기 시작했던 것은 2000대 중후반 LCD TV 들어서였다. 최근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업체들이 추격이 거세지만 두 업체는 여전히 글로벌 TV 시장을 호령하고 있다.
다음 세대 TV의 모습이 어떤 형태일지 내다보긴 쉽지 않다. 기술적으로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모두 유기물 기반으로 번인 현상에서 자유롭지 못한 OLED를 뛰어넘을 QD(퀀텀닷)-LED 패널을 연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무기물 소재를 사용한 자발광 QD-LED TV 등장 시점은 짧게 잡아도 10년 이후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이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10년은 OLED, 마이크로LED, 롤러블 TV 등이 치열하게 맞붙는 시대가 될 것"이라며 "어떤 TV가 대세가 될지를 지켜보는 것도 쏠쏠한 재미"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