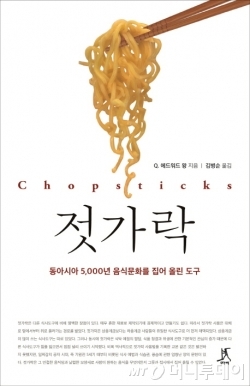
하지만 이 도구가 시작부터 인정받은 건 아니다. 옛날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주곡인 기장(벼의 일종)을 먹을 때, 중국 상류계급은 예절 해설서인 ‘예기’를 통해 “기장을 먹을 때 젓가락을 쓰지 말라”고 배웠다.
고깃덩이를 불에 구워 식탁 위에서 잘라 먹는 서양의 식습관이 포크와 나이프의 발달을 가져왔다면, 뜨겁게 끓여 먹는 방식을 선호한 중국의 음식 문화는 젓가락의 융성을 이끌었다.
한나라에서 당나라까지 이뤄진 중국 농업과 음식 문화의 변동으로 젓가락은 한반도와 일본, 동남아시아 등 주변국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젓가락은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청동제품으로 추정된다. 저자 Q.에드워드 왕은 “한국의 뛰어난 금속공예 기술과 금, 철, 구리 등의 풍부한 매장량이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가정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중국에선 ‘공동 식사 문화’가 정착하면서 젓가락의 길이와 위치가 바뀌었다. 상 위에 가로로 놓던 젓가락 위치가 식탁 가운데 있는 음식을 향해 세로로 놓이게 됐고, 음식 위치로 길이도 평균 25cm 이상으로 길어졌다.
일본은 개별 식사 방식을 선호하는 문화 때문에 가로 위치에 길이도 짧다. 특히 한 번 입에 들어갔다 나온 젓가락에는 사람의 영혼이 붙는다고 해서 쓰고 바로 버릴 수 있는 나무젓가락이 애용됐다.
한 쌍을 동시에 움직여 사용하는 젓가락은 떨어질 수 없는 ‘커플의 특성’으로 약혼이나 결혼 선물로 주로 쓰였다. 중국에서 젓가락은 재질에 따라 다른 상징적 의미를 내포했다.
한비자는 상아 젓가락을 사치와 방탕의 상징으로 읽었고, 금 젓가락은 신하의 강직하고 곧은 성격에 비유했다. 이백의 문장에 쓰인 옥 젓가락은 여인의 눈물을 비유하는 문학적 수사였다.
젓가락은 그러나 낯선 외국인에게 긍정과 부정의 평가를 동시에 받았다. 19세기 중반 중국을 찾은 영국 외교관 로런스 올리펀트는 “서양의 품위 없는 포크와 나이프보다 고상한 젓가락이 제격”이라고 치켜세운 반면, 영국 여행가 이사벨라 버드는 “식탁마다 악취가 풍기는 젓가락들이 한 뭉치씩 대나무 용기에 꽂혀 있었다”며 혹평했다.
수많은 평가 중 프랑스 평론가 롤랑 바르트의 찬사가 가장 오랫동안 귓가에 맴돌지 모르겠다. “젓가락은 지치지 않고 어머니가 밥을 한입 떠먹이는 것 같은 몸짓을 하는 반면, 창과 칼로 무장한 서양의 식사 방식에는 포식자의 몸짓이 여전히 남아있다.”
◇젓가락=Q.에드워드 왕 지음. 김병순 옮김. 따비 펴냄. 416쪽/2만2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