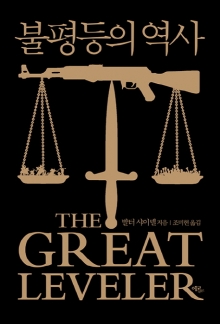
한 국가 내에서도 불평등은 존재한다. 미국을 예로 들면, 현재 미국 내 최고 부자 20명이 하위 50% 가구의 자산을 모두 합친 것만큼의 부를 소유하고 있고, 소득 상위 1%가 국민 총소득의 5분의 1을 차지한다.
그렇다면 역사상 때때로 발생한 부의 재분배, 그리고 여기서 비롯된 빈부격차의 완화는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 책에 따르면 역설적이게도 그것을 이뤄낸 힘은 ‘폭력’이다. 저자는 △대중을 동원한 전쟁 △변혁적 혁명 △국가실패 △치명적 전염병 등 네 가지를 '평준화의 네 기사(騎士)'라고 명명했다. 이들에 대적할만한 효과를 거둔 수단은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1, 2차 세계대전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프랑스는 1차 대전 이후 자본금의 3분의 1이, 2차 대전 이후 그 두 배인 3분의 2가 사라졌다. 영국도 1차 세계대전 중 국부의 14.9%를, 2차 세계대전으로 다시 18.6%를 잃었다. 1937~1949년 소득 상위 1%의 소득 점유율이 거의 절반으로, 상위 0.01%의 점유율이 3분의 2가량 떨어졌다. 미국의 경우 1916~1945년 소득 상위 1%는 총소득에서 그들이 차지한 비중의 40%를 잃었다.
두 전쟁의 잔해로부터 생겨난 급진적 혁명은 또 다른 격변을 낳았다. 러시아의 경우 레닌의 토지령 등 급진적인 법령으로 모든 것을 국유화했다. 1937년 소비에트 농업의 93%가 강제로 집단화하고 개인 농장은 완전히 붕괴했으며, 민간 부문은 소규모 정원으로 줄어들었다. 과격한 사회구조 조정으로 물질자원에 대한 접근권한을 재분배하기 위해 엄청난 폭력이 수반됐다. 여기서 비롯된 사망자 수와 인류의 고통은 세계대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역사상 최대 평등화 동력은 아이러니하게도 폭력이었던 것이다.
이 시각 인기 뉴스
폭력만큼 전 대륙을 쑥대밭으로 만든 것은 전염병이었다. 페스트, 천연두, 홍역이 과거 농경사회에선 인구의 3분의 1 이상을 앗아갔다. 노동력이 부족해지면서 실질 임금이 상승하고 임대료가 하락해 결과적으로 노동자는 이익을 보고 지주와 고용주는 손해를 입었다. 엘리트들은 물리력과 지시를 동원해 기존 체제를 지키려 했지만 시장의 힘을 제어하는 데 실패했다.
저자의 불평등 해소 방법에 대한 전망과 견해는 상당히 비관적이다. 책에는 미국 대법관 루이스 브랜다이스의 '민주주의를 채택할 수도 있고, 소수가 막대한 부를 가지도록 할 수도 있지만, 둘 다를 가질 수는 없다'는 언급이 나온다. 부의 평준화(빈부격차 해소) 여부는 폭력(또는 무력)의 규모가 좌우한다는 견해도 곁들인다. 피를 부르는 전쟁 이후로 가장 극적인 변화가 이뤄졌다는 것.
책은 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않는다. 책에 실린 구체적인 자료와 기록들을 통해 그 같은 해법을 고민하는 것은 오롯이 독자의 몫이다.
◇ 불평등의 역사 = 발터 샤이델 지음. 조미현 옮김. 에코리브르 펴냄. 768쪽/4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