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우리금융 민영화 '이번엔→이번에도(?)'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2010.07.06 14:47
지난 2006~2007년은 여러 모로
우리금융 (11,900원 0.0%)지주의 최전성기였다.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이란 '족쇄'를 차고도 두 해 연속 당기순이익 '2조 클럽'에 가입했다. 주가도 2007년 한 때 2만5000원을 웃돌았다. 시장에선 우리금융 민영화의 '최적기'란 말이 나왔다.
정부에서도 공감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우리금융 민영화는 결국 유야무야됐다. 정부는 여의치 않은 시장 상황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이전 정권 임기 말 대형 인수합병(M&A)을 추진할 동력이 부족하다는 정치적 이유가 더 큰 배경이었다. 이른바 '변양호 신드롬'(정책적 책임회피)으로 불리는 관료들의 '보신주의'도 한몫했다.
그리곤 2년이 흘렀다. 정부는 작년 말부터 우리금융 민영화 의지를 또 다시 불태우고 있다.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번엔 꼭 한다"고 수차례 공언했다. 정부는 그러나 상반기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 확정이란 '시장과의 약속'을 스스로 뒤집었다. 7월 중순 이후 민영화 로드맵 발표가 가능할 것 같다고 했지만 그마저도 불확실하다.
그러다 보니 시장에선 확인되지 않은 소문만 넘쳐나고 있다. "금융당국이 내놓은 우리금융 민영화 방식에 대해 청와대가 '노'(NO)했다" "특정 금융회사와 합병시키기 위한 시간벌기 아니냐" "금융당국조차 총대를 메려 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온다. 사실이라면 예나 지금이나 '관치'(官治)가 우리금융 민영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이다.
정부나 금융당국도 나름대로 고민이 적지 않을 것이다.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와 국내 금융산업 발전을 동시에 충족할 현답(賢答)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국내외 금융시장의 여건은 여전히 녹록치 않다. 금융당국이 마련해 놓았다는 여러 민영화 방안도 현재의 시장 상황에선 적용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최근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선 '실기'(失期)했다는 반성도 나온다고 한다. 그나마 시장 여건이 괜찮았고 우리금융 주가도 높았을 때 팔지 못 했다는 늦은 후회다. 하지만 넋만 놓고 있다간 또 다시 때를 놓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금융당국이 "민영화 의지에 변함이 없다"(진동수 금융위원장)고 누차 강조하고 있는 만큼 정부 내 논의 과정에서 현명한 해법이 나오길 기대한다.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정부가 매번 '양치기 소년'으로 불려서야 되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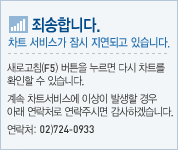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